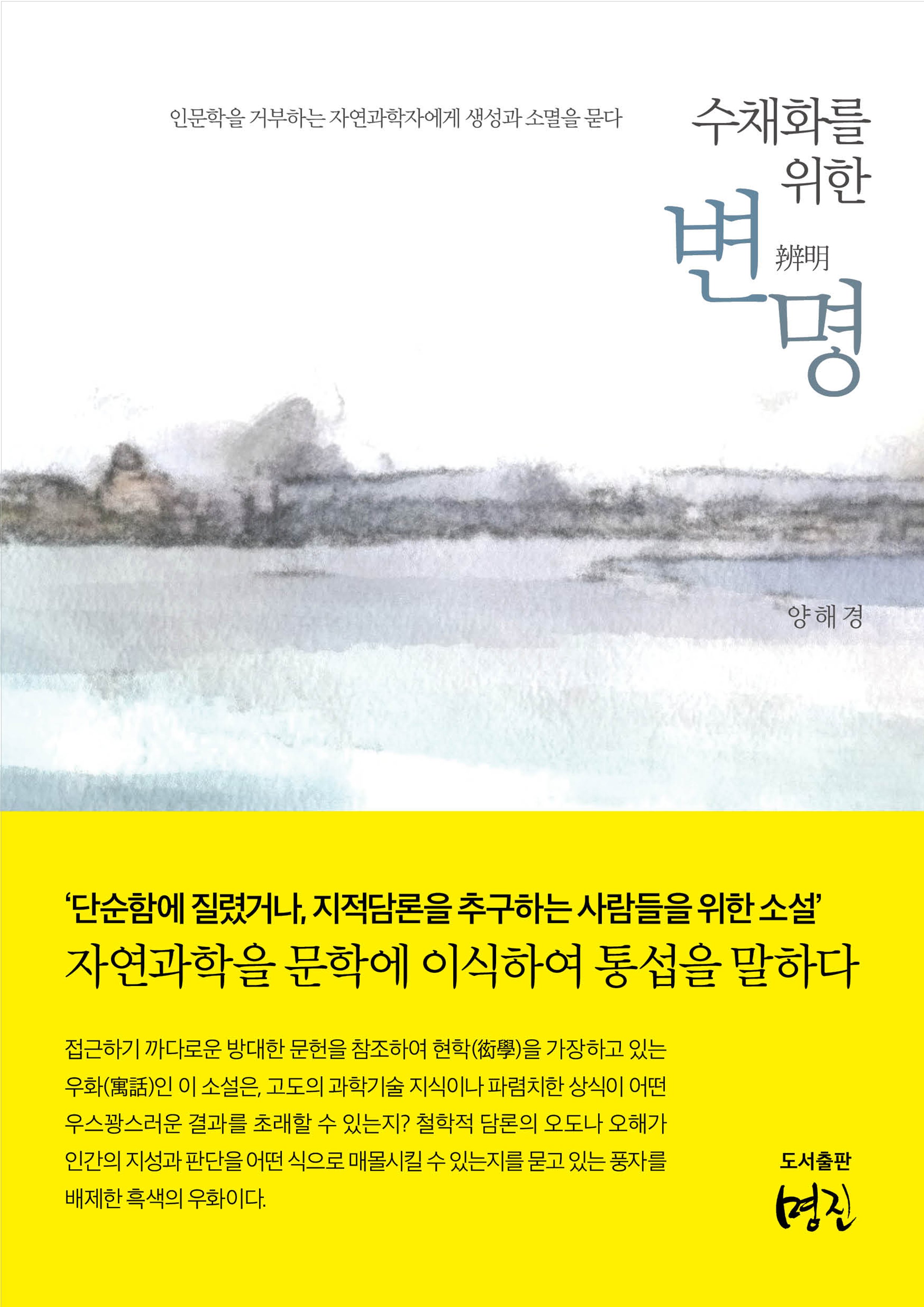교보문고 바로가기 Click!
■ 책 소개
이 소설은, 지극히 현학적인 표현 수단을 동원하여 완전무장의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를테면, 방공호 수준의 시멘트벽 같은 껍질로 포장된 비정한 우화이다. 그 껍질의 두께가 어느 정도의 강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는 소설을 완독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독자는 우화가 건네는 메시지의 의미를 발굴하려면 만만치 않은 해체도구가 필요하다. 축조되어 있는 방호벽이 워낙 견고하고 정교한 틀을 지니고 있기에 이것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함정들이 구석구석에 지뢰처럼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제거하려면, 독자는 어지간한 과학적 상식과 지식을 보유해야 함은 물론이고, 게다가 광범위한 인문학적 이해의 폭과 통찰의 개념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럴싸한 현혹에 휘말려 자칫 오인하기가 쉽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풍자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우화임을 짐작할 수 없도록 탄탄하게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작가가 의도하는 노림수라고 본다.
이 책을 저술한 저자의 의도는 자연과학을 토대로하는 이학분야나 공학분야의 철학적 사유가 인문학과는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학문이라는 고정된 관념을 파괴하고자 하는 다소 엉뚱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분야가 생소한 일반 독자는 도저히 난해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고도의 물리학이론인 양자역학을 소재로 도입하고 있으며 과연 문학적인 서술만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언급한적이 있던 ‘표현은 삶의 흐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라는 의미를 확대하여 ‘오로지 삶의 흐름 속에서만 표현이 의미를 갖는다’면 죽음의 흐름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하고 또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뇌하며 산문을 엮어 소설을 쓰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저자의 판단은 삶과 죽음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종교적인 차원을 배제한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노자의 우주론과 양자론적 우주론은 일치하여 있음(有)과 없음(無)을 동질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출판 서평
시경(詩經)의 소아(小雅)편 정월(正月)의 고사에 등장하는 수지오 지자웅(誰知烏 之雌雄)이라는 경구가 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분할 수 있으랴?’는 뜻으로, 형태가 교묘하여 함부로 흑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풍자가 없는 우화는 좀체 그 속성을 분별해내기가 어렵다.
작가는 소설의 도입부에서부터 서슴없이 투명한 메타포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첫 장 부터 물아일체의 철학적 사유와 상당히 흡사한 고도의 학문적 영역인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을 뜬금없이 등장시켜(실은 작가가 의도하는 으뜸의 주제는 이것이다. 작가는 삶과 죽음 즉, 소멸과 생성이 결코 단절이 아니며, 반드시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작가의 주장은 분명한 근거를 지닌 과학적 주장이며, 컬트적 분위기와 종교적인 차원을 초월한다.) 가엾은 독자의 혼을 빼놓지만, 누구도 감히 이러한 논거를 반박할 틈새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 어지간한 독자라면 반박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만만치 않다. 방어의 벽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재구성이 되는 창작과 유효한 컨셉의 표절에 관한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부터가 창작인지, 또는 인용과 표절, 오마주와 패러디의 경계와 구분을 흩뜨려놓고 스토리를 엮어 나간다. 본격적으로는 세계적인 작가이며 철학자이자 기호학 분야의 석학인 ‘움베르토 에코’를 등장시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댄 브라운’을 빗대어 음모론을 표절한 멍청이로 비하시키고, 이론물리학자 ‘리사 렌들’을 등장시켜 거시세계의 현실과는 사뭇 동떨어진 그들만의 이론인 우주의 다차원에 대한 존재여부를 환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학문적 근거를 내세워 교묘하게 포장해 나간다. 이 역시 반박의 근거나 꼬투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결정적인 우화 한 토막은 기성세대인 7080세대들에게 익숙한 과거의 주간잡지로서 일약 삼천만의 교양지(?)로 군림하고 있던 <선데이서울>의 프라이버시 Q&A에 단골메뉴로 곧잘 등장하던 “선생님! 어쩌면 좋아요. 넘지 못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키스만 해도 임신이 되나요?” 라며 울부짖는 ‘가리봉동 고민녀’ 시리즈를 지독하게 패러디하여 20세기식 산부인과 의사와 21세기식 전문가 답변을 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작가는 매우 정교하고 장황하게 답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 결과 양자생물학자인 과학자는 임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는, 썩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그러나 독자는 이것이 우화임을 전혀 짐작할 수 없도록 고난도의 양자물리학 이론과 그럴싸한 ‘특이점’논리를 제시하며, 당대에는 모르지만 후대에는 필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키스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의 유전자 전이가 가능하다는 검증되지 아니한 엉터리 가능성을 슬그머니 열어둔다. 파렴치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말의 의구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을 반증이라도 하듯, 유효한 참조문헌 등을 제시하여 독자의 판단력을 잔뜩 흐려놓는다. 문제는 탄탄한 이론으로 무장한 논리에 정보가 없는 독자는 요목조목 반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파렴치한 전문가 집단의 사기술 같은 집단지성 이기주의를 완벽하게 비꼬고 있는 것이다.
개중에 눈치 채기 어려운 우화는 스토리 전반에 포설되어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를 입장시켜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를 사상의 표절자로 몰아세우는가 하면, 양자역학의 ‘결깨짐’ 현상처럼 주인공인 나를 통하여 스스로 오이디푸스적 상황의 덫에 걸려 비로소 동일한 현상을 연출하고야 마는 심각한 자기모순적 오류를 저지르고 만다. 결국 주인공인 내가 뭉개놓은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이론이 끝내 자신을 공격하고 마는 회절(回折)같은 결론으로 파국을 맞이한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자기모순의 상황을 교묘하게 탈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필연이란 우연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신의 주사위 놀음’이라는 표현 그 자체는 난해하여 쉽게 이해되지 못한다는 양자역학의 현상과 정수를 거시세계인 현실에 도입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슬그머니 탈출하고 있다.
접근하기 까다로운 방대한 문헌을 참조하여 현학(衒學)을 가장하고 있는 우화(寓話)인 이 소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도의 과학기술 지식이나 파렴치한 상식이 어떤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인지불가의 과오는 용납이 되는지? 철학적 담론의 오도나 오해가 인간의 지성과 판단을 어떤 식으로 매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은근히 묻고 있는 풍자를 배제한 흑색의 우화이다.
현재까지 과학계의 정설로 알려진 원자의 불확정성에 따른 미시적 확률론은 거듭된 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이미 확증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측이나 검측이 불가능하다. 원자론의 시점에서는 비록 개체는 수명을 다한다 해도 원자의 존재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항구적이기 때문이다. 거듭된 인류의 역사를 반추(反芻)해 보면, 완벽한 사실이란 완벽한 허구처럼 엉성하여 어느 때고 뒤집히는 법이다. 결말에서 주인공이 독백으로 외치고 있듯이 존재함으로써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함으로써 존재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정의가 조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가 예언하듯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문의 : 최영무 이사 ☎ 02) 2164-3005 이메일 mjcp@naver.com